“내 속에서 솟아 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앞으로 소개할 책의 첫 문장인데 이 문장보다도 이 책에서는 다음 문장이 가장 유명하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말이다.
"새는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압락사스.“ (Der Vogel kämpft sich aus dem Ei. Das Ei ist die Welt. Wer geboren werden will, muß eine Welt zerstören. Der Vogel fliegt zu Gott. Der Gott heißt Abraxas.)
이번 칼럼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담긴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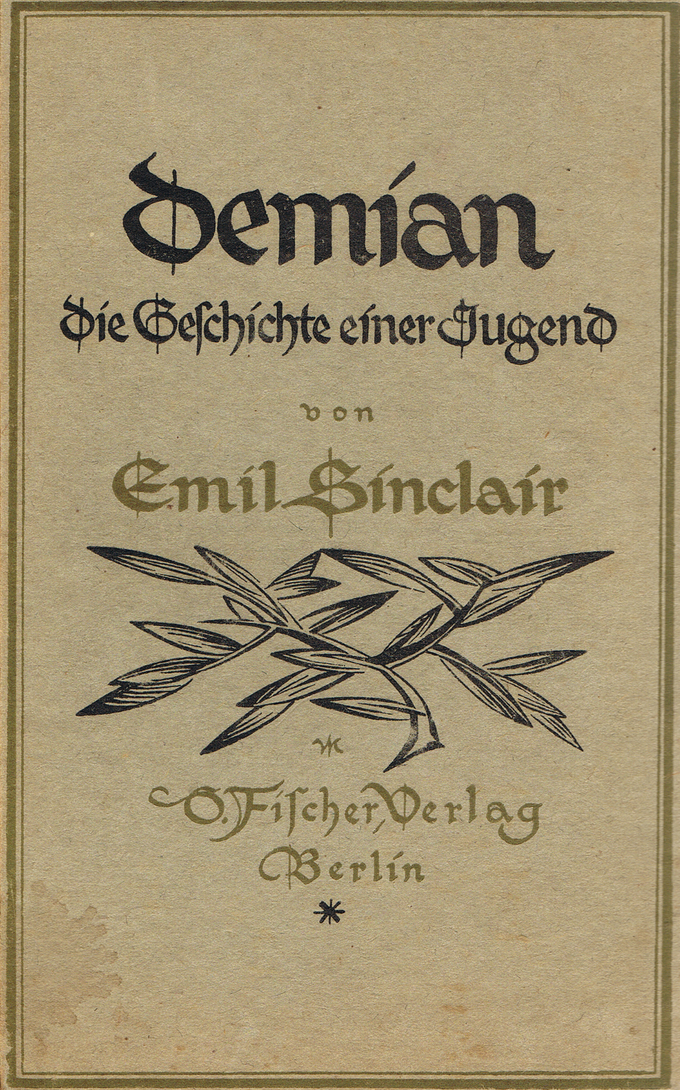

「데미안」은 제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1916년에 쓰이기 시작하여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출판되었다. 때문에 수많은 찬사 속에서도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책 속에서의 신비로운 묘사 방식은 전쟁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상징성이 지나치다는 평,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는 싱클레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결국 예민한 시대 상항 속에서의 문제가 과도한 상징들 속에서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미안」에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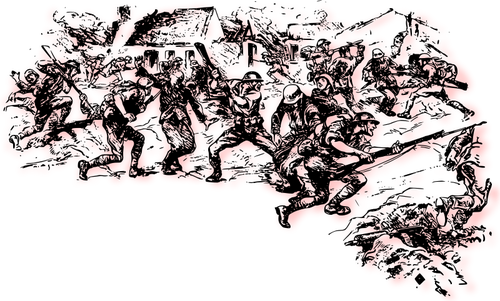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수만은 사람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책을 물려주었고, 추천해주었다. 그 자식들은 자라나 다시 자식들에게 책을 물려주었고, 추천해주었다. 그렇게 「데미안」은 100년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한 번 기억 속에 「데미안」을 넣은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었다. 그리고 다시 머리에 저장해두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데미안」을 찾고, 또 사랑하는 이유에는 「데미안」이라는 책에 담긴 철학적인 고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의 내적고민과 갈등, 데미안과의 대화, 에바 부인과의 만남을 묘사한 부분은 머리를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문장들이 아니다.

나 역시 「데미안」을 읽으며 한동안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고, 세상에 태어나 처음 해보는 고민들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비록 엇갈리는 평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칼럼을 계기로 하여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책으로 자리매김한 「데미안」이라는 책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이 접했으면 한다. 그리고 만약 「데미안」을 읽어보았다면, 이번 기회에 추억의 책을 다시 꺼내보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