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광고들. 또 광고들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광고 모델들. 광고계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흔히 유명 연예인, 셀럽들을 광고 모델로 발탁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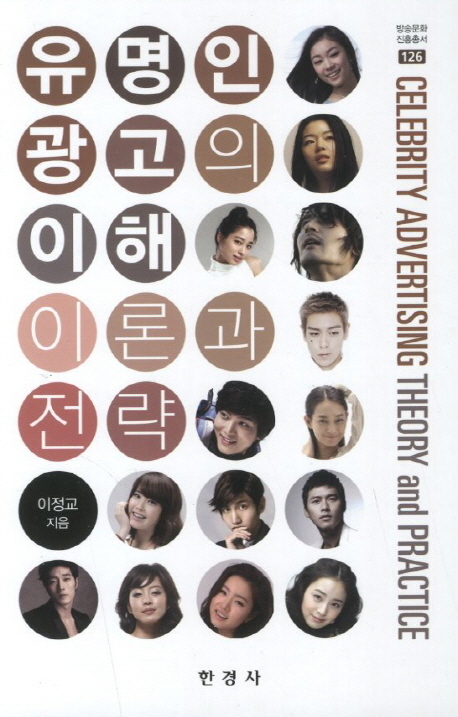
▲ 책 '유명인 광고의 이해 이론과 전략'
2012년도 출판된 '유명인 광고의 이해 이론과 전략'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정교'씨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 같은 경우 전체 광고 모델 중에서 TV광고 기준으로 유명인을 20% 정도로 쓰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50% 이상으로 평가되는데요. 한국 시장은 동일 업종 내에서 제품들 간에 차이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는 양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능적인 부분, 이성적인 호소로 차별화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브랜드들이 물리적인 속성에서 차별화를 두기보다 유명인 모델을 활용한 감성적인 부분, 이미지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TV광고 모델로 유명인을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그 이유는 한국 광고 시장에서는 제품들이 기능적으로 비슷한 면을 많이 보여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 어렵기에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에 비춰서라도 이목을 끌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일까?
그렇다면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들이 과연 좋은 효과를 보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광고 모델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는 광고의 소신 있는 내용과 콘셉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에도 무조건 유명세에 따라 결정하는 것 이 아닌, 광고의 이미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저 광고의 내용과 관련 없이 유명한 셀럽들만 사용하면 광고의 주의가 흐트러지고 광고하는 제품이나 기업을 기억하지 못하고 셀럽만 기억하게 되는 뱀파이어 효과 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브랜드나 기업을 기억하지 못하고 셀럽이나 유명인만 기억하게 된다면 그 광고는 단지 그 셀럽을 홍보하는 매개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 가지 예로 배우 송중기 씨가 찍은 수십 개의 광고들과 유명인이 나오지 않기로 유명한 현대카드의 광고를 들어보자.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크게 유명세를 타게 된 송중기 씨는 동원참치, 배스킨라빈스, 루헨스 정수기, 코오롱스포츠, 하이트맥주, 페리오 치약, KT, 쿠첸 등 정말 다양한 수십 편의 광고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이 많은 광고들 중 기억에 남는 광고가 얼마나 되는가? 필자는 이 중 하이트맥주와 배스킨라빈스 광고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필자가 인상깊게 본 현대카드의 광고이다.
이 광고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문구는 '카드의 방향을 바꾸다'라는 문구이다. 현대카드는 보통 가로로 사용하던 여러 카드들과 달리 세로 방향으로 사용하는 카드를 만들었고, 카드의 방향이 가로에서 세로로 바뀌었다는 내용과 함께 카드의 외관상의 방향이 아닌 카드가 나아가는 길, 즉 보다 더 새롭고 혁신적인 현대카드만의 카드로 이전 카드들과는 다르게 방향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 다른 경우를 하나 보자.
쌍둥이 자매인 진 포드와 제인 포드가 1976년에 설립한 미국의 화장품 브랜드인 '베네피트(benefit)'는 유명인 광고를 지양하는 브랜드로 개비(Gabby), 시몬(Simon), 라나(Lana), 베티(Betty), 비너스(Venus) 등의 마네킹들을 만화 캐릭터처럼 어울리는 화장품의 대표 모델로 등장시킨다.
이는 베네피트 브랜드의 개성이 되어 미국의 한 브랜드로 정착시킨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 같은 광고들은 광고에 셀럽을 사용하지 않고도 광고의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광고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고모델을 유명인으로 사용하면 나타나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
셀럽의 유명도가 제품을 더 튀어 보일 수 있게 하고, 제품에 차별화를 둘 수가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셀럽들이 광고모델로 사용된다면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와 닿을 수 있을까?
